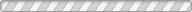합의와 협의
thinking
2024-07-08
합의와 협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네이버에 ‘협의 합의 차이’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노무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* '협의'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처분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
* '합의'는 노조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귀사의 인사규정에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조치는 무효일 것입니다.
재고용 관련하여 2017년 문구 유효하다는 회사 공문 및 노무사 답변 공문 잘 보았습니다.
예 공문으로 인하여 2017년 문구 유효한거 확인 되었죠.
하지만.
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
- 2017년 임단협 실무 협의록 : 재고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한다. 단, 특별한 결격사유는 중징계, 범법행외, 근태불량, 건강상 근로 불가능으로 한다.
-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: 2018년부터 운영중인 각 실 재고용협의회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확정하며, 필요시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확정한다.
2024년 잠정합의안에 어떤 ‘문구’가 추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.
‘재고용협의회’라고 되어있습니다.
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인사 처분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.
즉 재고용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.
이렇게 되면 누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인가요?
이것도 의혹이라고 생각하실까요?
근태불량과 건강상 근로 불가능의 기준도 없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?
예. 재고용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.
‘지금도 근태불량과 건강상 근로 불가능의 기준이 없지 않냐!‘라고 따져 물으실수도 있겠네요.
맞습니다. 지금도 그 기준이 없습니다.
애매한 상황이죠.
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재고용협의회가 명문화 되면 저희에게 좋은점이 있을까요?
저희에게 유리하려면 ’재고용협의회’가 아닌 ‘재고용합의회’가 되어야겠죠.
또한 우리는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문구 삽입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
회사가 임금 피크제에 CPI를 적용시켜주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에 위 2-3항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.
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직접 인정한 부분이죠.
회사가 임금을 더 줘가면서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지금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상황인가요?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?
마지막으로
자기 몫을 하지 않는 분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사례와 같이 재고용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.
저 또한 그런 분은 재고용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
하지만 그런 부작용 보다 회사가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?
회사가 재고용 제도를 악용하게 될 경우 그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?
네이버에 ‘협의 합의 차이’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노무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* '협의'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처분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
* '합의'는 노조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귀사의 인사규정에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조치는 무효일 것입니다.
재고용 관련하여 2017년 문구 유효하다는 회사 공문 및 노무사 답변 공문 잘 보았습니다.
예 공문으로 인하여 2017년 문구 유효한거 확인 되었죠.
하지만.
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
- 2017년 임단협 실무 협의록 : 재고용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한다. 단, 특별한 결격사유는 중징계, 범법행외, 근태불량, 건강상 근로 불가능으로 한다.
-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: 2018년부터 운영중인 각 실 재고용협의회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확정하며, 필요시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확정한다.
2024년 잠정합의안에 어떤 ‘문구’가 추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.
‘재고용협의회’라고 되어있습니다.
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인사 처분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.
즉 재고용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.
이렇게 되면 누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인가요?
이것도 의혹이라고 생각하실까요?
근태불량과 건강상 근로 불가능의 기준도 없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?
예. 재고용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.
‘지금도 근태불량과 건강상 근로 불가능의 기준이 없지 않냐!‘라고 따져 물으실수도 있겠네요.
맞습니다. 지금도 그 기준이 없습니다.
애매한 상황이죠.
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재고용협의회가 명문화 되면 저희에게 좋은점이 있을까요?
저희에게 유리하려면 ’재고용협의회’가 아닌 ‘재고용합의회’가 되어야겠죠.
또한 우리는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문구 삽입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
회사가 임금 피크제에 CPI를 적용시켜주기로 하고 잠정합의안에 위 2-3항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.
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직접 인정한 부분이죠.
회사가 임금을 더 줘가면서 2024년 잠정합의안 2-3항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지금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상황인가요?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?
마지막으로
자기 몫을 하지 않는 분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사례와 같이 재고용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.
저 또한 그런 분은 재고용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
하지만 그런 부작용 보다 회사가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?
회사가 재고용 제도를 악용하게 될 경우 그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?